나는 소설가 작도의 팬이었고, 나 또한 소설가로서 그의 문장을 훔치고 싶었다. 아니 정말 말 그대로 그의 문장을 훔치고 싶었다. 그래서 소설을 배운답시고 작도의 문하생으로 들어갔다.
문하생이라고 특별히 할 것은 없었다. 작도가 소설을 쓰는 동안 출판사 담당자를 만나거나, 오탈자를 봐준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물품을 사오는 정도의 자잘한 일을 대신해주는 정도였다. 가끔 돌아오는 길에 메로나를 사오면 작도는 좋아했다. 작도는 나와 메로나를 같이 먹으며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
작도의 신작 장편 소설은 도대체 진도가 나가지를 않았다. 인간이 신에게 도전해서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나름 자기의 인생작으로서 심혈을 기울였으나 솔직히 능력이 따라주지를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적당한 시점에 그의 소설을 훔쳐서 내 이름으로 발표할 생각이었으나, 세 달이 지나도록 진도가 안 나가니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보다못해 작도에게 소설을 바꿔보라고 했다. 신적인 존재는 너무 거창하니 신을 사칭하는 인간 대 인간의 이야기로 바꿔보라고 말이다. 작도는 좋은 생각이라고 나를 칭찬하고 이야기를 술술 풀어가기 시작했다. 작도는 이야기가 막힐때마다 나를 찾았고, 나는 막힌 부분을 대신 써주기도 했다. 내가 쓰는 문장이 점점 늘어났고, 이야기의 흐름이 전형적인 내 스타일로 바뀌었다. 나는 낭패라고 생각했다.
결국 한달만에 소설을 완성했으나 솔직히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나는 작도의 팬으로서 크게 실망했다. 작도의 단점은 그렇다 쳐도, 내 단점까지 소설에 녹아든 것이 실망스러웠다. 그래도 잘만 고치면 괜찮아질 것 같았기에, 나도 일상적인 잡무들을 중단하고 둘이서 소설만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세 달을 고쳐쓰니 겨우 적당한 수준이 되었다.
나는 내가 참여한 만큼, 이번 소설은 공동 저작으로 내거나 내 이름으로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작도는 화를 냈다. 이건 자기의 소설이고, 나는 어디까지나 도와준 정도이니 안된다고 했다. 정 원하면 책머리에 “감사한 분들” 정도에는 언급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작도와 크게 싸웠다.
나는 이제 슬슬 소설을 훔쳐서 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소설을 고쳐쓸수록 문장이 나아지는 걸 느끼면서, 나는 그 시점을 조금씩 늦출수 밖에 없었다. 한달 한달이 지날수록 소설이 확연하게 좋아졌다. 그렇게 1년을 고치니 소설은 탐이 날 정도로 아름다워졌다.
하루 종일 소설을 쓰고 있자니 방에 홀아비 냄새가 가득했다. 나는 청소를 하고 페브리즈를 뿌렸다. 그러니까 방이 조금 산뜻해졌다. 페브리즈 향도 은은히 남았다. 그러자 작도가 너무 좋아하며 나를 카오리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이 소설의 저자를 작도와 카오리라고 내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나름 작도로서는 많이 양보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작도가 나를 카오리라고 부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일본 오타쿠스럽기도 했지만, 그보다 나에 대한 작도의 애정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작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작도를 사랑할 수 있어도, 작도는 나를 사랑하면 안됐다.
소설을 쓰기 시작한지 1년 6개월째가 되자, 소설은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완성이 되었다. 근데 그 몇몇 부분에서 작도와 나의 생각이 너무 달랐다. 특히 결말이 달랐는데, 작도는 이 작품을 자신의 인생작으로서 신성하게 끝내고 싶었고, 나는 그보다는 인간들의 부조리함을 강조하며 끝내고 싶었다. 아무리 대화를 해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그의 문하생이었고, 이대로 가다간 작도의 의도대로 끝낼 것 같았다. 그것은 작도의 스타일이었지, 나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나는 어느새 작도의 문장이 아니라 내 문장을 탐하고 있었다. 이 소설을 내가 원하는대로 끝내고 싶었다. 나는 조바심이 났다.
나는 내 버전을 출판사에 보냈다가 작도에게 들키고 말았다. 그러자 작도는 작도의 버전도 출판사에 보냈고, 출판사는 둘 다 읽어보더니 당연히 내 버전을 더 좋아했다. 작도는 크게 마음이 상했다.
작도는 한참 고민하더니, 내 버전이 더 좋은게 사실이니 내 버전으로 내기로 결정했다. 자신의 이름도 빼기로 했다. 다만 저자를 카오리로 하라고 했다. 나는 기쁜 동시에 너무 화가 나서 작도를 주먹으로 치고 말았다. 오랜 저작활동으로 다리가 부실해졌는지, 작도는 기우뚱하더니 책장을 쓰러트리고 거기에 깔려 죽었다. 나는 크게 놀란 한편으로 안도했다. 작도의 숨이 단번에 끊어졌기 때문이었다.
작도의 장례를 치르고 나는 이번 소설을 작도의 이름으로 내기로 출판사와 협의했다. 물론 내 버전의 이야기로 말이다. 인세는 유족들과 협의해서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다. 책 홍보를 다니면서 내가 공동 집필했다는 얘기도 했고, 작도가 그만 죽는 바람에 너무 슬펐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거짓은 아니었다. 슬픈 건 사실이었다.
눈물의 인터뷰가 화제가 된 후 나에게도 원고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지금은 나의 장편 소설을 쓰고 있다. 작도와 1년 6개월을 같이 집필하며 나눴던 여러 아이디어들을 노트에 빼곡히 적어놨는데, 이 정도면 내가 평생을 써도 넘칠 분량이다. 이 아이디어들을 이제 내 문장으로 풀어내면 된다. 이것이 작도의 팬으로서 내가 작도에게 보답하는 길일 것이다.
작도에게 내가 앞으로 쓸 모든 책을 바친다. 사랑을 담아.
2020년 10월 19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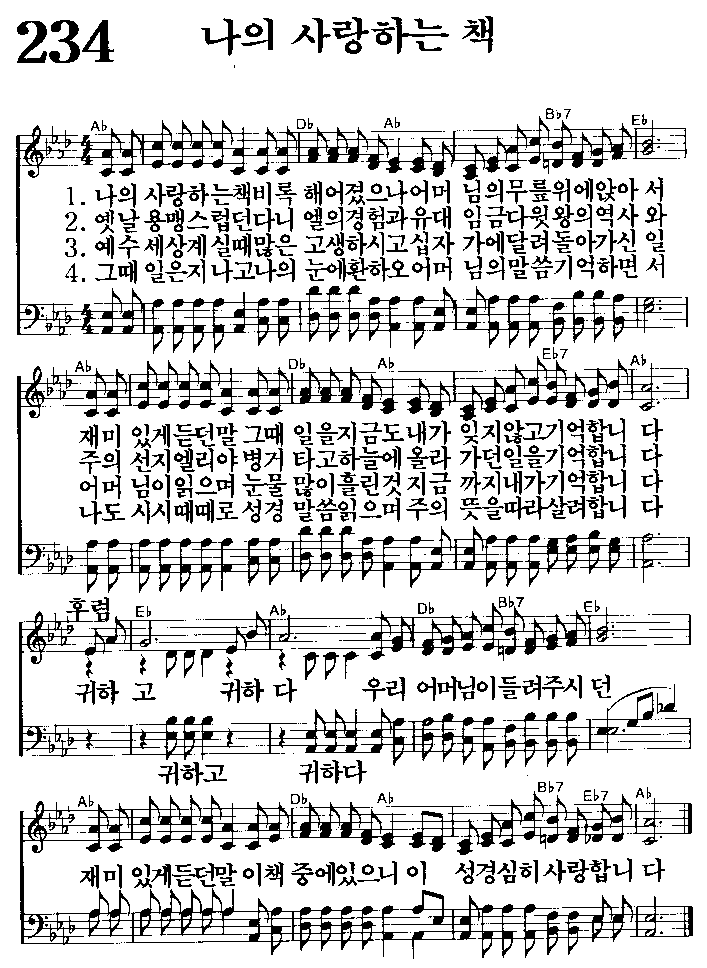
여전히 잘 살고 계셨군요. 추억속의 이름이었는데
문득 궁금해서 검색했다가 홈페이지가 우연히 나와서
경악(…) 하고 잠시 글 몇 개 읽고 갑니다.
저 (…) <- 이 표현도 못 보고 안 쓴지도 거의 20년이 좀 안 되어가는데
여튼 계속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
nullcode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